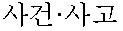노무현 대통령도 어느덧 2년차 대통령이 되어간다. 처음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누구도 그의 당선을 점치지 못 했듯 오늘날 노무현대통령이 이런 정치적 현실을 선사할 것이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못 했을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정치라는 줄을 타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불신감과 정치인들을 희화화시키는 패러디까지 등장하게 만들었다.
사상초유의 탄핵정국을 맞이하고 다시 대통령의 자리에 설 때까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써 그 기간내내 무엇을 생각했는지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 자리는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하다.
게다가 서로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다짐했던 2년전의 약속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지역감정없이 국민을 통합시켜 정치에 참여케 하겠다던 그 굳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은 사람도 없었지만 이런 분열이 초래할 것이라 믿은 사람도 없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잠시 야당의 세력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된다는 것은 아무도 예상못한 국난이었다. 그게 어디 대통령 한 사람이 약속했다고 해서, 한 사람만의 노력만으로 될일인가 생각하며 달래보기도 했지만 사상초유의 사태앞에서는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사태로 분명해진 것은 노대통령은 처음부터 짐을 잘못 꾸렸다는 것이다. 차곡차곡 짐을 쌓으면 가방은 크게 부풀지도 않고 짊어진 사람도 크게 무게를 느끼지 못 할 것이다. 그런데 무작정 구겨넣은 옷가지며 짐들은 가방을 쓸데없이 크게 만들뿐아니라 얼마 못 가 다시 짐을 꾸려야할만큼 무거움을 느낀다. 이처럼 노대통령은 국민들이 준 한 표와 신뢰를 욕심껏 참여정부의 가방에 쑤셔넣었다. 이 때 노대통령의 짐을 꾸리는 것을 도와준 이들은 누구 하나 올바른 조언을 해주지 않고, 대통령과 같이 짐을 구겨넣어 빨리 길을 떠날 것을 재촉했다. 뒤늦게 가방이 팽팽해지고 길가에 짐이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그는 줄타기 곡예를 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가 줄에 올라 몇발자국 가자마자 가방속의 짐들은 모두 떨어지고 말았다.
그가 처음 짐을 꾸려야했던 것은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이었다. 국민들은 적어도 탄핵정국이 끝나면 그가 갈라진 당을 통합시킬 수 있는 히든카드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는 또 다시 억지로 짐을 가방에 구겨넣고 정치의 줄을 타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의원의 정수장학회를 비롯하여 독재의 잔재가 남아있다며 여당과 함께 야당인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색깔론 VS 유신, 독재정권의 잔재의 싸움으로 치닫고 마는 결과를 초래한 지금도 노대통령은 여전히 당쟁의 중심에 서 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한 시대에 함께 정치를 해 나간다는 점에서 "견제"의 세력이 아니라 "공존"의 의미로 화해를 해야한다. 국민들의 지역 통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만이 약속의 실천이 아니다. 겉으로는 지역감정의 해소를 울부짖으며 끝없이 당쟁을 유발시키는 발언을 하는 어불성설을 보이는 것이 현재 대통령의 모습이다. 국민들은 정치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곡예를 보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2년 전 그가 한 약속과 초심을 기억하기 바라며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현정부가 지고 가야 할 짐들을 가방에 차곡차곡 정리하길 바라는 것이다. 끝으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한 당의 존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